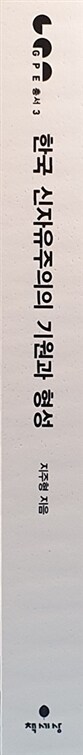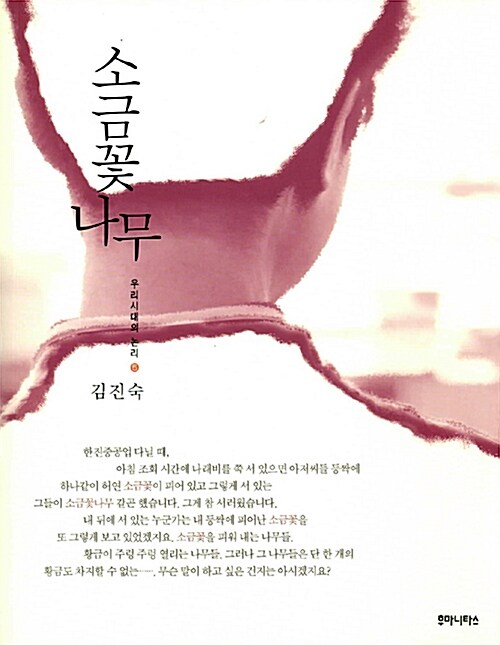소금꽃나무를 추천하는 이유
‘회사원 근로자도 아닌 노동자라니!’ 제목의 ‘노동자’가 마음에 안 들어 펴 보지도 않던 전태일 평전을 처음 펼친 1984년 비 오는 날의 김진숙을 떠올려본다. 처음으로 스스로 부끄러워 지리산 계곡처럼 꺼이꺼이 울었다는. 기본급 13만 6100원이던 1986년, 1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밤의 김진숙을 떠올려본다. 밤새 천장에 새파란 종이돈이 어른거렸는데 조합원들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을 것 같아 돌려줬다는. 후마니타스라는, 좀체 와닿지 않는 이름의 출판사의 연락을 받은 뒤 잘려 나갈 나무가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한 김진숙을 떠올려본다. ‘성찰할 때가 되지 않았나.’ ‘두렵더라도 나부터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.’ 그가 이 깨끗한 욕심과 타협해 책을 내어 얼마나 다행인지. 세상의 어수선함을 물 끼얹듯 잠잠케 하는 절창의 시. 깃발이자 피켓이자 전단이었던 이 책은, 김진숙이 먼 길을 걸어 ‘사람 나무’와 연대할 때마다 다시 펄럭이며,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들어 올린다.